지난 2월 마지막 주.. 회사에서 제주도로 MT를 다녀왔다.. 이미 가족들과 몇번의 여행을 통해 접했던 제주도였지만 찾아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접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나름 기대가 되었던 MT였고 역시나 제주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김영갑이란 이름은 갤러리를 방문하면서 처음 접한 것이었다.. 출발 전 귀동냥으로 제주도의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접한 것이 전부였다.. 깁영갑 갤러리(두모악)는 시골 동네의 작은 폐교를 갤러리로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갤러리 초입에 짙은 주황색의 양철로 만든 듯한 조각 작품 하나가 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겉으로 본 갤러리의 모습은 단촐했다.. 작은 토우들로 정원을 꾸민 것이 전부였고 그 어느 것 하나 특별히 튀어 보이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삼달국민학교라는 패가 예전에 이 자리가 학교였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저 기둥 사이에 자리잡았을 교문으로 그 언젠가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지나갔으리라.. 날씨가 매우 좋았지만 제주도 답게 바람이 매우 거셌던 터라 빨리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몸을 녹일 참이었다.. 마침 갤러리 뒷편에 무인찻집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함께한 일행들과 커피를 마신 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다..


갤러리 입구 매표소 건너편에 김영갑 작가의 작업실이 보존되어 있었다.. 작업실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이생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던 터라 단순히 어느 작가의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으로만 갤러리를 받아들이고 있던 나에게 그 사실은 공간을 접하는 마음을 달리 먹게 만드는 암묵의 힘이 있었다..

갤러리 안은 학교 교실 벽을 허물고 다시 꾸민 것처럼 보였다.. 넓은 공간에 전시되고 있는 사진들은 작가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연작 형식으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 변하는 자연의 모습(특히 구름이나 빛의 모습들)을 담아낸 사진들은 동일한 곳이라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게 바뀌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고인의 사인은 루게릭병이라 했다.. 매일 무거운 삼각대를 메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다녔기에 처음에는 근육통이 좀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줄 알았다 한다.. 갤러리 구석마다 적혀있던 글귀들은 그가 이름도 흔히 듣기 힘든 병마와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가를 알게 했다.. 때론 원망으로 때론 체념으로 적어져 내려갔던 글들이었지만 결국은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며 나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담겨진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작업실 한켠에 보관되어 있던 생전에 고인이 읽었던 책들의 모습.. 그 책 들 사이에 눈에 들어온 '사람을 살리는 생채식'.. 제목을 접한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애정이 어떠했을까를 떠올리며 순간 마음이 울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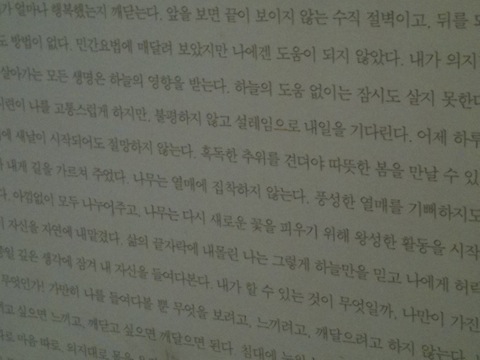
나무는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결국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사실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버리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과정이 있었기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 김영갑 갤러리의 방문은 그것이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자연의 모습임을 느끼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다..
김영갑이란 이름은 갤러리를 방문하면서 처음 접한 것이었다.. 출발 전 귀동냥으로 제주도의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접한 것이 전부였다.. 깁영갑 갤러리(두모악)는 시골 동네의 작은 폐교를 갤러리로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갤러리 초입에 짙은 주황색의 양철로 만든 듯한 조각 작품 하나가 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겉으로 본 갤러리의 모습은 단촐했다.. 작은 토우들로 정원을 꾸민 것이 전부였고 그 어느 것 하나 특별히 튀어 보이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삼달국민학교라는 패가 예전에 이 자리가 학교였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저 기둥 사이에 자리잡았을 교문으로 그 언젠가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지나갔으리라.. 날씨가 매우 좋았지만 제주도 답게 바람이 매우 거셌던 터라 빨리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몸을 녹일 참이었다.. 마침 갤러리 뒷편에 무인찻집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함께한 일행들과 커피를 마신 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다..


갤러리 입구 매표소 건너편에 김영갑 작가의 작업실이 보존되어 있었다.. 작업실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이생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던 터라 단순히 어느 작가의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으로만 갤러리를 받아들이고 있던 나에게 그 사실은 공간을 접하는 마음을 달리 먹게 만드는 암묵의 힘이 있었다..

갤러리 안은 학교 교실 벽을 허물고 다시 꾸민 것처럼 보였다.. 넓은 공간에 전시되고 있는 사진들은 작가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연작 형식으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 변하는 자연의 모습(특히 구름이나 빛의 모습들)을 담아낸 사진들은 동일한 곳이라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게 바뀌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고인의 사인은 루게릭병이라 했다.. 매일 무거운 삼각대를 메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다녔기에 처음에는 근육통이 좀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줄 알았다 한다.. 갤러리 구석마다 적혀있던 글귀들은 그가 이름도 흔히 듣기 힘든 병마와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가를 알게 했다.. 때론 원망으로 때론 체념으로 적어져 내려갔던 글들이었지만 결국은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며 나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담겨진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작업실 한켠에 보관되어 있던 생전에 고인이 읽었던 책들의 모습.. 그 책 들 사이에 눈에 들어온 '사람을 살리는 생채식'.. 제목을 접한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애정이 어떠했을까를 떠올리며 순간 마음이 울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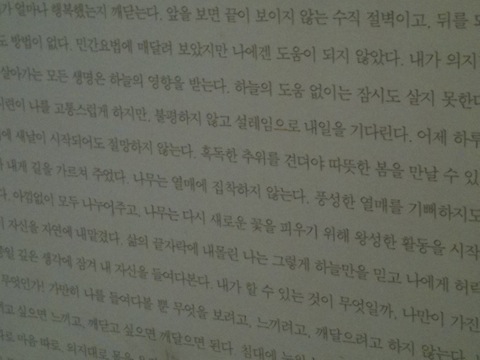
나무는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결국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사실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버리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과정이 있었기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 김영갑 갤러리의 방문은 그것이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자연의 모습임을 느끼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다..